“유월 늦은 밤의 어둠은 흥건한 풀냄새와 나무 수액 냄새, 썩어가는 음식 쓰레기 냄새로 뒤범벅이 되어 있었다. 아이를 데려다준 뒤, 여자는 버스를 타지 않고 두 시간 가까이 서울의 중심부를 통과해 걸어 돌아왔다. 어떤 거리는 대낮처럼 환했고, 매연으로 숨이 막혔고, 음악소리가 요란했고, 어떤 거리는 캄캄했고, 후락했고, 버려진 고양이들이 쓰레기봉지를 이빨로 뜯으며 그녀를 노려보았다. page 61 “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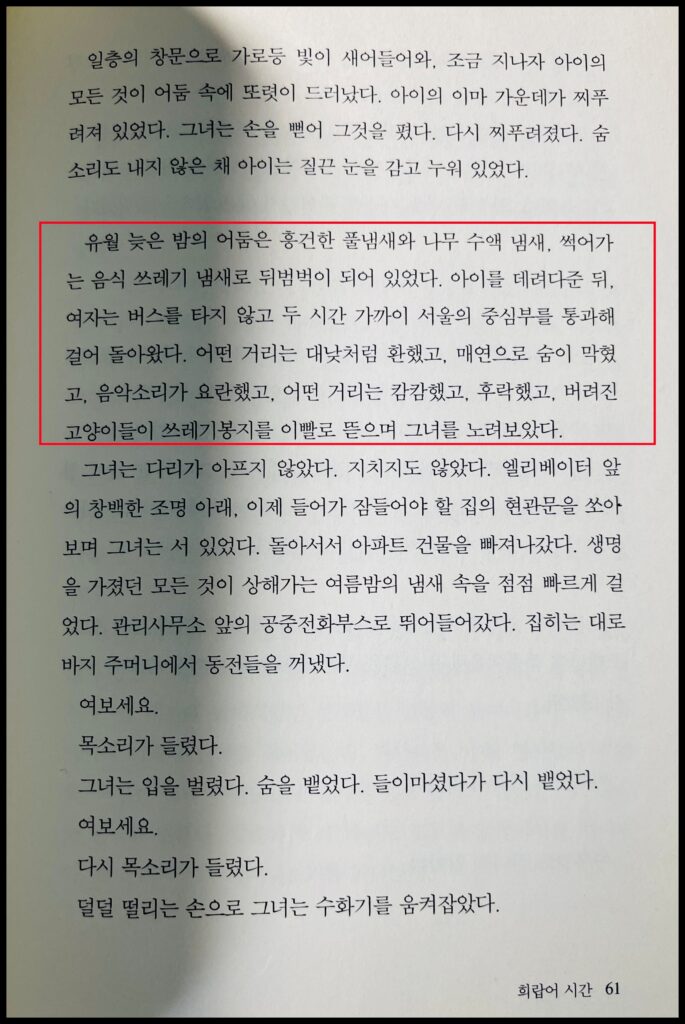
한강작가님의 책들을 재읽기 하고 있다. 그 중 12번째 책, 장편소설 ‘희랍어 시간’이다. 이 책은 그 전에도 읽으면서 꽤나 진통을 겪었던 읽기에 부쳤던 책 중에 하나였다.
그래서 그런지, 두 번째 읽음에도 잘 읽혀지지가 않는다. 나에게 다소 어렵고 쉽지 않은 책중에 하나이기도 하다.
그렇게 어렵게 읽고 있는 와중, 그 이야기에 생각나는 추억이 떠올랐다.
물론, 이 소설의 내용과 그녀가 느끼는 다른 감정이다.
첫번째,
정확하게 기억나진 않지만, 아마도 고등학교 시절인 것 같다. 친한 친구와 성수동 뚝섬역에서 친구의 친구를 만났다. 요즘 흔히 말하는 그냥 여자 친구였는데 뚝섬역에서 헤어지고 그 친구와 무슨 연유였는지 차비가 없었던 건 아니었는데 그 친구의 집 회기동까지 걸어온 기억이 있다.
왜 그랬을까?
성수동에서 동일로를 지나 중화동까지 와서 다시 회기동 삼육대학병원까지 그와 나는 무슨 생각으로, 무슨 이야기를 나누며 왔을까.
그리고 그 밤, 새벽 풍경은 어떠했는지…..는 기억이 없다. 그리고 그 친구는 동창회 회장을 통해 내 연락처를 알려 주었지만, 본인이 연락을 하겠다고 했지만 연락은 없다.
두번째,
첫번째 회사에서 만난 동기들과 퇴사후 우린 그 당시 자주 종로에서 만나곤 했다.
종로에서 술 한잔을 하고, 자연스럽게 동대문까지 걸아와 두타인지, 밀레오레인지에서 심야영화를 보고 답십리까지 걸어오곤 했다.
그들과는 1년이 조금 넘은 시간을 함께 했지만, 그 기간동안 비슷한 처지 또는 비슷한 성향때문인지 다른 이들과는 다른 끈끈한 정을 느끼곤 했고, 각자 다른 생활로 잠시 소원해지기도 했지만 아직까지도 연락하며 일년에 두 세번 정도 만나는 관계가 유지되고 있다.
막연하게 그 밤과 새벽을 걷는 나를 생각한다..
그 걷기가 가져다주는 그 무언가, 그때만큼은 나를 비롯해 나와 걷는 그와 그들에게 솔직한 나의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을까? 또한 그와 그들의 솔직함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았을까.
가끔, 아주 가끔은…..그때가 그립기도 하고, 생각나기도 한다.